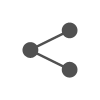“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전도서7:2)
폐렴증세로 중태였다가 회복되어 요양원에서 요양하시던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지난주일 밤 10시쯤 전해왔다. 다른 일정들이 미루어지고 월요일 아침 인천의 장례식장으로 찾아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작은댁 사촌들은 전날 밤 임종을 지키지 못한 황망함속에 장례식 둘째 날 아침의 조문객이 없는 쓸쓸함을 눈물로 지키고 있었다.
산다는 것은 안개와 연기나 바람처럼 쉬이 사라지는 가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서로를 위로하고는 있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움을 덮어버리는 죄송스러움이었다.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왜 사는가?’를 지나 초상집에서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 슬픔이 내게도 있지만, 그 어두운 슬픔에 짖눌리지 않을 소식이 내겐 있었다.
일 년 전 그러니까 작년 6월 4일에 문득 작은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다. 13년 전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혼자 사시는데 허리가 좋지 않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 예배도 못가신다는 소식도 들었던 차라 그 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조용히 찾아가 만나 뵙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졌다.
노인의 삶이란 TV가 벗이 되는 거실이 안방이었고 시끄러울만큼 트롯트쇼가 나오는 가운데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다. 가만히 그분을 보노라니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증조할머니 장례식에 상여가 산 길을 올라갈 때 어린 나를 업어주신 분이 작은아버지이셨다. 그 든든한 어깨는 세월 탓으로 조금 움츠려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기품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기척이 없으셨는데 큰소리로 두 번 부르자 일어나 앉으시면서 “어, 어쩐 일이냐 만천이 아니냐?” 마스크를 쓰고 안경까지 걸친 얼굴인데 기억하시고 알아보셨다.
이런저런 집안 얘기를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작은아버지 제가 목사입니다. 작은아버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하셨다. 그래서 곧이어 “그럼 지금 죽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갈 것을 믿고 작은어머니 만날 것을 믿습니까?” 질문을 드리자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럼!‘ 하신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지요…“하고 기도해드렸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일년 전에 그 기도의 순간이 내면의 밑바닥으로부터 차오르는 고요한 평안함이 되었기에 사촌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로했고 장례의 마지막절차인 하관의 순간에 숙모님의 장례식 때처럼 대표해서 기도하고 차례차례 흙을 덮도록 안내하였고 봉분이 차오를 때까지 함께 자리했다.
주 예수님안에서 동역자되고 형제된 김만천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