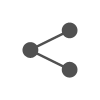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 달. 별 공기 땅, 바람. 산. 물. 흙 주님이 손으로 만드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내 눈으로는 볼 때,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하루에 열 두 번도 더 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전도서 1:9)
안성에도 배를 타고 감을 건너가는 ‘강 전너 페리(ferry)‘[명사/여객을 태우거나 자동차를 실어 운반하는 배]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산도. 둘레길도 꽃과 잔디가 있는 그런 식당이 있었습니다. “와~~~” 배를 타고 가니 새로움도 있고. 시원함도 있고, 신선함도 있었습니다.
매운탕과 삼겹살을 시켜 맛나게 먹고 커피를 들고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동행하셨던 분이 “이 강이 어떻게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람에 부딪히는 강물은 살랑살랑, 아기의 웃음소리 같았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피부를 살랑살랑 간지럽혔습니다. 나에겐 그런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강은 내가 흘린 눈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산에서 부는 바람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였고 강물에 살랑거림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고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기에 지금의 감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면서 이 보다 더한 건 없겠구나.” 하시면서, “지금의 힘듦을 잘 이겨내면 버틸만한 여유와 감사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았을텐데, 내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오래 버티다 보니 웃는 날이 오더라구요.” 그 말씀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나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배를 타고 왔던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늘 그대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변하고 흔들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내 모습은 그저 갈대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에 성품을 닮아서 그저 안아줄 수 있는 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님.”
-최금순 집사-